인문의 시선으로 본 제4차산업혁명-‘인간 이성의 임계치’(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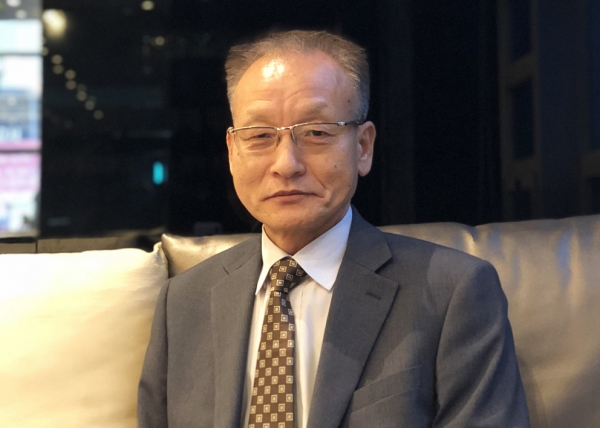
데카르트도 갈릴레오도 천재였다. 전자는 광학, 해부학, 수학의 ‘기본’을 창시한 사람이고, 후자는 ‘운동은 곧 정지’라는, 이른바 제네시스(창세)의 원리를 뒤엎는 시도로 목숨까지 잃을 뻔 했다. 또한 빠뜨리면 섭섭해할 사람이 라이프니츠다. 데카르트와 쌍벽을 이루는 수학 원리의 조물주로서, 오늘의 디지털혁명도 그의 이진법에 멀리 기원을 두고 있음은 상식이다. 이들 천재들이 태어나고 살았던 때는 17세기다. 그 무렵 유럽은 온통 30년 전쟁의 소용돌이에 신음하고, 혁명과 반동으로 날을 지새던 아수라장이었다.
그 와중에도 이들은 감히 세상과 우주에 원초적 질문을 던졌고, 신성(神性)이 아닌 이성, 관념이 아닌 경험에 눈을 떴다. 로크처럼 ‘인간’의 가치를 새롭게 규정했고, 버클리나 흄처럼 인성(人性)의 원론부터 다시 획정했다. 자연을 오로지 인간의 언어로만 설명하려 했던 태도를 과감히 버리고, 자연 언어를 새로이 창설했고, 마침내는 신과 종교로부터 자연과학을 분리시키며 무궁한 자연의 섭리를 경험과 인식으로 묘사한 것이다. 그 결과는 신천지의 창조였다. 그때 인간은 1만년 전 인간과 겉모양은 같았지만, 그 본질에 있어선 전혀 다른 종(種)이 되었다. 그래서 이전 문명과는 철저한 ‘단절’이었고, 새로운 인류의 시작이었다.
이는 마치 어느 ‘시점’에서 본 데자뷔와도 같다. 그 시점이란 바로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가까운 미래, 곧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로봇공학 등으로 점철되는, 이른바 4차산업혁명 기다. 이는 데카르트와 갈릴레오, 라이프니쯔의 유례없는 과학혁명, 그 세계사적 터닝 포인트와 흡사하다. 흡사하다기보단, 어쩌면 인류가 태어난 이래 ‘첫 번째 인간’의 멸종기가 17세기라면, 오늘은 그 ‘두 번째 인간’의 멸종을 눈 앞에 두고 있다. 곧 예전 과학혁명이 그랬듯이 또 하나의 인류사적 ‘단절’을 앞두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단절’이 곧 인간과 세계의 ‘끝’이 될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시작’이 될 것인가. 그 대답은 우리 시대를 사는 모든 이들의 임무이기도 하다. 예컨대 정형이 아닌, 모듈, 곧 분절과 대체에 능한 유연함 혹은 빌렘 플루서가 말한 ‘알파벳 코드를 이용한 선형성’과의 결별이 그 실천적 사변(思辨)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이슈나 사안, 가치, 이념이건 이젠 딱딱한 고형화(固形化)의 형체, 고정된 실존체를 고집해선 안 되는 이치다. 쉽게 말해 어떤 조재든 이제 가변적이 되어야 하고, 그 참여자 혹은 생산, 소비자 모두 유연하고 기민한 변용과 변형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눈 앞의 존재들을 바로 다음 순간엔 또 다른 플롯의 판본으로 무한하게 변형, 제조할 수 있는 탄력적 역량을 갖춰야 하는 것이다.
이는 마치 온라인 게임의 이치와도 같다. 게이머는 이야기, 플롯 등을 스스로 빈칸이나 ‘괄호’의 여지가 있는 ‘모듈’로 만들고, 그 빈칸에 실시간으로 대체 가능한 무한한 입력값을 채워넣는다. 이때 게이머 혹은 사용자는 그 결과를 무한하게 생성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존재인 것이다. 이를 문명 전체로 확장해보면 시대 가치, 만유의 미덕, 인간애, 평등의 가치 등등까지도 그런 모듈화의 대상이다. 그 대상 안에서 각각 ‘모듈’ 형태로 분절되어있는 미시적 가치나 행위, 담론 조각들에 대해 이 시대의 참여자 모두는 실시간으로 늘 변용을 가한다. 그러면 모듈의 전체 조합인 ‘대상’ 혹은 가치는 애초 생성 당시의 플롯 속성을 잃지 않은채 또 다른, 더 큰 객체로 끝없이 조합되곤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인간성에 대한 더 큰 시야와 해석, 이성이란 이름으로 행해지는 온갖 반인문적 실체들에 대한 더 큰 성찰이 반복되는 것이다.
돌이켜보면 절대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이를 모듈화한 빈칸을 만들어 스스로 채우고 창조했던 사람들이 곧 데카르트요 갈릴레오였다. 이들이야말로 디지털혁명기를 관통하며 ‘살아있는 것’의 재창조자가 되게 하는 ‘포스트 휴먼’의 선조인 셈이다. 온 세상이 온오프의 점멸로 구축된 디지털 시대. 그로 인한 제2의 인류사적 ‘단절’이 또 다른 시작이 되려면, 그야말로 새로운 철학이 있어야 하고, 닥쳐올 미지의 물음에 대해 적절히 응답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론 인간 이성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 과연 인간 이성의 임계치는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17세기 선구자들을 오늘에 소환함은 그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