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의 시선으로 본 제4차산업혁명-‘인간 이성의 임계치’(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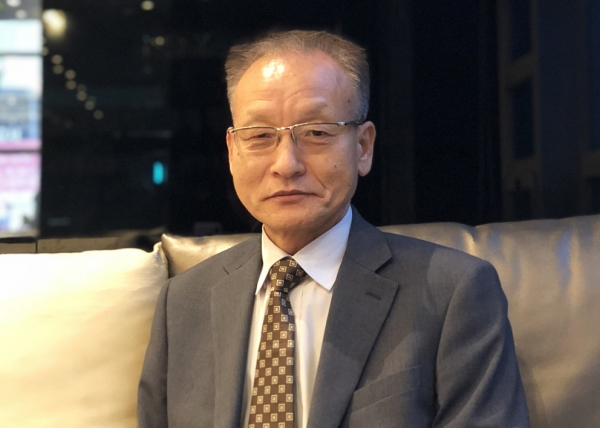
죽음은 인간의 숙명이다. 좀더 객관화하면 인간의 존재방식을 구성하는 중요한 계기다. 인간은 본시 스스로에게 “인간이란 무엇인가?”, 혹은 “왜 내가 인간인가?” 따위의 질문을 늘 하기 마련이다. 존재하면서도 항상 그 ‘존재’ 자체가 문제가 되며, ‘존재’를 끊임없이 질문하는 존재자, 즉 ‘현존재’가 인간이다. 만유의 영장답게 인간만이 오로지 그런 존재론적 혹은 생물학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신비한 존재다. 그런 인간의 필연적인 존재방식은 바로 죽음이다. 죽음은 그것을 구태여 논리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실존적 진리이며, 이를 증명하고자 하는 것은 사변(思辨)의 과잉 아니면, 의도된 종교적 도그마일 뿐이다.
그러나 4차산업혁명은 감히 이런 ‘진리’까지 전복하려 한다. 시공간과 차원을 초월한 온갖 첨단기술과 초자연적 지능으로 죽음을 없애고, 영생(永生)을 기하고자 한다. 첨단 시뮬레이션 기술, 인공지능을 넘어선 인공생명(AL)을 만들고, 그저 가상 세계의 ‘건조한(dry) AL’이 아닌 실제 현실에 존재하는 ‘젖은 생명(Wet-Life)’으로서 AL을 탄생시키고자 한다. 마침내는 기술과 기계로 만들어진 초인적 경지인 트랜스휴먼을 통해 영원히 사는 호모데우스를 목표하고, 이를 통한 포스트휴머니즘을 구현코자 한다. 이른바 테크노퓨처리즘의 발흥(勃興)이다.
그렇다면 포스트휴머니즘과 테크노퓨처리즘이 꿈꾸는 ‘영원히 사는’ 미래란 어떤 것일까. 과연 그 미래란 것이 진정한 인간 존재의 ‘미래’인가. 그래서 다시 죽음이란 무엇인가를 되새겨볼 일이다. 미래의 끝은 본래 죽음이다. 죽음은 실현되지 않은 가능성이지만, 그것이 과연 닥쳐올 것인가에 관한, 어떤 증명도 필요하지 않는 절대적 확실성을 갖는다. 그렇다고 ‘인생’이라는 선분의 끝에 가서야 맞닥뜨리는 종말이 아니라, 살아가는 매순간의 ‘현재’에 언제나 침투해 들어오며 ‘현재’를 구성한다. 즉 인간의 존재에 언제나, 그리고 이미 현존해있는, 인간의 또 하나 존재방식이다.
여기서 다시 미래와 현재의 존재 방식이 문제가 된다. 인간의 시간은 동물의 삶과는 달리 그저 직선으로 표시되는 시계열 단위만은 아니다. 과거의 삶, 미래에 구성되어야 할 삶이 모두 현재의 시간, 공간과 관계맺으며 함축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항상 미래의 어떤 가능성을 미리 앞질러 유추하며, 자신의 ‘현재’에서 ‘현존재’를 기획하고 실현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미래를 미리 당겨 ‘현재’에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닥쳐올 미래는 지금 현재보다 앞서, 그 현재의 플롯을 구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때 죽음은 그런 현재와 미래의 결정 요소다. 인간으로선 죽음을 ‘확정되고 확실한 불가능성’으로 순순히 받아들이며, 죽음이 오기 전 이루고자 하는 미래를 꿈꾸며 현재의 존재를 ‘실현’해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의 존재 실현 과정은 곧 ‘죽음을 향한 존재’이며, 그것으로 인해 인간에게는 오히려 아직 실현되지 않은, 실현하고 싶은 모든 것과의 관계가 열린다고 하겠다. 반드시 죽을 운명에 대한 명확한 인식, 혹은 ‘죽음을 향한 존재’의 끝에 마주한 죽음은 또다른 존재적 삶의 시작이기도 하다.
그런데 테크노퓨처리즘은 이런 섭리를 뒤엎으려 한다. 마치 ‘존재’의식이 없는 동물이나 짐승이 그러하듯, 그저 선형적이고 물리적인 시간에만 근거하여 미래의 존재방식을 이해한다. “2050년 이후에는 죽음이 없는 영생의 존재 ‘포스트휴먼’의 전성기가 올 것”이라며 의기양양해 한다. 마치 맹목적인 ‘성공’이 내적 성찰이나 정신적 성장을 결여하는 것과도 같다. 허나 진정한 미래는 ‘죽음을 향한 존재’의 끝에 있다. 죽음 덕분에 현재의 존재를 실현해가는 현존재 곧 ‘인간’다운 삶의 결실로서 획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테크노퓨처리즘은 아무리 너그럽게 해석해도, 과학 이성과 합리를 숭배해온 근대성의 유산이 낳은 폭력이나 진배없다. 심하게는 영생은 커녕, 영원한 죽음을 자초하는 첨단의 야만일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