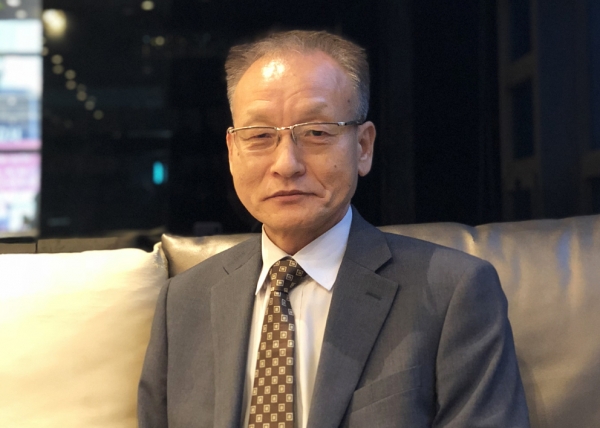‘공유’는 폭력적인 소유와 사유에 반발한 존재 방식이다. 제로섬의 공식이 작동하는 시장이 아닌, 비(非)시장에서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교환한다는게 그 본래적 의미다. 좀더 진화한 형태로는 서버에 의한 중앙집중식 통제가 아니라, 개인대 개인(peer&peer)의 네트워크로 상호 협력적 소비를 하는 방식이다.
요즘 ‘카풀’ 사태로 새삼 시선을 모으는 공유경제는 이처럼 그 원론적 취지는 무척이나 선(善)해 보인다. 더욱이 재화나 서비스의 소유가 아니라, 그저 교환 ․ 대차만 함으로써 별도의 생산 ․ 유통에 드는 한계비용도 제로 수준이다. 다가오는 기술자본주의 시대에도 딱 들어맞는 삶의 방식이다. 기업과 소비자 간에 있어온 거래비용이나 경제조정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어, 소비 대중 다수의 최대 효용을 기할 수도 있어 좋다.
그래서 클라우스 슈밥 등 4차산업혁명 이론의 원조들은 이를 가장 핵심적인 ‘혁명의 미덕’으로 숭배하기까지 한다.
최근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카풀’과 택시계의 대치 국면에서 ‘택시의 우버화’를 예고했다. 택시라는 서비스에 공유경제의 모델로 꼽히는 ‘우버’ 방식을 접목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택시업계 또한 싫지만은 않은 표정이다. “정보통신기술을 통한 택시 편의성 확대는 업계가 시행하고 싶어도 주무 부처가 규제로 막아온 사안”이라며 사실상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다.
일단 겉으로 비친 공유와 공유경제는 이렇게 평화로운 공존을 위한 첨단의 미덕으로까지 통한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21세기 ‘호모이코노미쿠스’에게 무조건 장밋빛 미래만을 선사할 것인가. 이에 대해 MIT계열의 에릭 브리뇰프슨 등은 매우 부정적이다. 애초 지금 운위되는 ‘공유경제’는 태고적 순수시대의 ‘공유’와는 다르다는게 그들의 관점이다.
사이버 네트워크와 이진법 세계관에 기초한 디지털시대의 또다른 착취구조로 그들은 보고 있다. 문제는 이른바 긱 경제(gig economy) 혹은 온 디맨드 경제(On Demand economy)다. 쉽게 말해 변변한 직장이나 직업이 아닌, 허드렛 잡일에 평생을 걸고 전전긍긍하며 입에 풀칠하는 경제다. 그것도 대부분의 경제주체들이 다 그렇다는게 문제다.
당장 쓰지않는 자동차를 빌려주고, 현재의 대리운전보다 더 불안한 카풀 기사로 연명하거나, 집마당 빈 곳을 주차장으로 내놓고, 남는 방을 하룻밤 숙박시설로 빌려주는 등 ‘잡스런’ 수입으로 겨우 살아간다. 기껏 해봐야 단기계약 수준의 일회성 고용이 성사되는게 고작이다. 그런 비표준 노동이 정규 노동 대신 표준의 직업으로 행세하며 경제를 지배하는게 긱 경제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자칫 경제활동인구의 대다수가 ‘잡일꾼’으로 전락할 수도 있는 모양새다. 정규 직장에서 주어지는 모든 급여나 근무조건은 옛말이 되어버리고, 긱 경제로부터 일감을 받은 노동자들은 복지나 생존을 위한 안전망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대신 벌어지는 건 ‘격차’이며, 더해지는 건 ‘착취’다. 긱 경제에서 가장 득을 보는 이들은 빅데이터와 사용자 경험을 수집하고 재생산하는 앱 제조자와 애그리게이터(aggrigator)들이다. 이들 시장 조성자들은 네트워크 참여자들, 즉 다수 긱 노동자들의 소득을 빼앗아 부를 축적하며, 소득불균형을 심화시킨다. 기업가적 리스크와 비용을 모두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손 안대고 코푸는 식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과 연결하며 엄청난 돈만 벌면 된다.
긱 경제와 ‘앱’ 기업은 비겁하기까지 하다. 실물경제의 기본인, 잉여 가치를 현금화하는게 아니라, 잉여 노동자들을 끌어들이는 방법을 구사한다. 심하게 말하면 노동시장 실패의 부산물이자, 그로부터 ‘떡고물’을 얻는 잡스런 매뉴얼이란 비아냥을 살 수도 있다.
우버가 택시면허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에어비앤비가 임대 부동산의 폭등을 유발해, 값싼 숙박시설과 안정적인 장기임대시설의 씨를 말리는 등의 부정적 사례만을 굳이 들추고 싶진 않다.
하지만 ‘공유’가 새삼 우리 경제의 주요 화두로 떠오른 요즘, 이에 대한 치열한 고민과 사유가 필요하다. 그게 과연 인류 모두가 행복을 공유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정녕 새롭고 유연한 직업 혁명의 시초인가, 아니면 비정규 프리랜서가 직업의 표준이 되는 자유방임적 노동착취의 도구가 될 것인가? 이에 대한 사회적 고민과 공동체적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렇다고 공유경제를 외면해선 결코 안 될 것이다. 이는 4차산업혁명과 디지털혁명기 경제와 삶의 피할 수 없는 공식이다. 단지 그것의 그늘을 최소화하고, 그 열매를 널리 풍성하게 공유하기 위한 법과 제도, 시스템의 완비가 필히 함께 해야 하는 건 분명하다.
우선은 공유를 빙자한, 일방적이고 저열한 상혼에 대한 소비 대중의 지혜와 분별이 중요하다. ‘우버’의 반면교사랄까. 네트워크의 빅브라더격인 시장 조성자(애그리게이터)가 이윤과 성장만을 위해 공유망을 작동시키는 과정을, 공동체가 대폭 제한할 수단과 권리를 획득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네트워크 참여자들(기사, 자가 대여자 등)에 대한 착취에 저항해 일정 기간 공유 네트워크의 유해한 특정 거래를 작동치않게 한다든가, 시민들이 소비자 스트라이크를 통해 건강한 공유를 추구하는 압도적 힘을 과시하는 것도 전략일 수 있다. 교육이나 캠페인, 사회적 각성, 혹은 20세기 미국의 반트러스트법처럼 공공복리에 방점을 찍은 법과 제도의 개입도 중요하다.
중요한 것은 진정한 ‘공유’의 실현이다. 나 아닌 다른 것을 정복하기보단, 이해하고 협력하도록 애쓰며, 무한성장보단 선택적 성장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공감과 협조가 작동하는 네트워크, 자발성과 창조성, 합리적인 소통, 지속적 피드백이 기능하는 네트워크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공유경제’는 인류에게 축복이기보단, 재앙이 될 수도 있다.
오늘도 택시업계는 불법 카풀 영업의 중단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어찌됐든 카카오와 택시의 다툼은 어떤 방식이든 마무리될 것이다. 문제는 그 뒤켠엔 어른거리는, 두 얼굴을 가진 ‘공유경제’의 민낯이다. 정작 착잡한 건 그 때문이다.
박경만<본지 논설주간>